Road Impression
































포드 토러스는 90년대 한국차가 북미시장에서 지금처럼 인지도와 점유율을 발휘하기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모델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 경찰차, 그리고 포드가 보유했던 렌터카 회사에서 매년 구매하는 비율 등 B2B에 공급하는 물량에 약간의 B2C만 얹어져도 자연스럽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모델이었다.
토러스의 역사는 86년 1세대를 시작으로 92년도 2세대, 그리고 3세대가 나온 96년도 3.0 DOHC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으며, 2000년부터 나온 4세대 모델로는 캐나다에 있을 때 여러 번 렌터카로 시승했던 적이 있다.
2008년도에 등장한 5세대 토러스는 50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고, 현행 6세대 모델은 2010
데뷔했다.
내가 토러스를 마시막으로 시승했던 것은 2001년 캐나다에서 4세대로 여행을 했을 당시이니
토러스를 다시 만난 건 거의 15년만이다.
고성능 버전인 SHO의 역사는 89년도에 등장한 1세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차는 몰아보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것이 야마하에서 만든 V6 3.0엔진이 7000rpm을 돌릴 수 있었다는 점과 5단 수동변속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포드가 SVT(Special Vehicle Team)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나름 토러스에만 SHO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고성능카를 만들어 왔음에는 토러스에 대한 애착이 상당했음을 나타낸다.
이번에 시승한 2012년식 SHO는 V6 3.5 트윈터보 에코 부스트 엔진으로 370마력을 발휘한다.
신차 가격이 514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격대비 출력면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는 없을 정도로 가격대 출력비가 높은 차이다.
6단 자동변속기에 20인치 휠, 스포츠 서스펜션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
오랜만에 타보는 미국차는 역시 낯설다.
차의 크기도 그렇고 좌석의 높이, 특히 뒷좌석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
전륜 기반 4륜 구동 370마력짜리 대형 세단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SHO라는 고성능 뱃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감동을 전해줄지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차에 오를 때의 기대나 긴장감은 오히려 이미 세대별로 거의 모든 버전을 타왔던 독일제 최신 고성능 버전을 탈 때보다 더 컸다.
1단부터 가속패달을 끝까지 밟았다.
가로배치 전륜기반이기 때문인지 약간의 토크스티어가 있지만 심하진 않았다.
실측으로 측정해본 0->X00km/h는 6.1초만에 끊었고, 최고속도는 계기판상 Y10km/h까지 달려보았는데, 370마력의 변별력을 가질 정도로 어떤 속도대에서건 힘차게 가속되었다.
처음부터 시승을 마칠 때까지 엔진에 대한 완성도나 느낌 그리고 터보 엔진이 주는 어느 경계를 넘어 힘이 상승해서 쥐어짜면서 나오는 출력은 상당히 꽉 찬 느낌이었다.
변속기가 너무 쉽게 킥다운을 허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변속의 질감이나 느낌이 괜찮았다.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국차라는 부분은 가격에 맞는 수준의 파워트레인을 확보했느냐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뜻이다.
무조건 큰 풍채와 형편없는 서스펜션 그리고 조악한 품질 등 갈수록 미국차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사라져가는 시점에 엔지니어링이라는 잣대로 차를 꼼꼼히 살펴보면 미국차는 여전히 헛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신 미국차들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나름 상당한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
하체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평형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주기 힘들다.
이는 주행 중 차가 평형을 유지한 체 아래 위로만 바운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기우뚱하면서 차체가 바운스를 한다.
다시 말해 승객의 몸이 좌우로 미세하게 계속 흔들리면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데이터가 없는 차로 항상 테스트 하는 고속코너 구간을 X90km/h로 던져 보았다.
이때 버티려고 하는 롤에 대한 강성은 차의 크기에 비하면 좋은 수준이었지만 이때 만나는 바운스에 대책이 약했다.
4륜이지만 가로배치 엔진의 고출력 모델에서 기대하는 언밸런스한 느낌은 없지만 그리고 하체가 그리 출렁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차체 상단 전반부와 하체가 기분 좋은 일체감으로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말하면 구체적인 서술을 생략하고 생각보다는 좋았다고 간단히 정리하고 싶다.
과거 타보았던 토러스의 하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리허카 하체에 커다란 바디를 올려놓은 그런 차였던 것과 비교하면 발전은 있었다.
제동 능력은 초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는데, Y00km/h가 넘어간 상황에서 아주 미세한 제동 몇 번에 디스크가 심하게 달궈졌는지 제동소음이 발생하고 패달 느낌이 조금 딱딱해지는 현상이 왔다.
긴장감 넘치는 과격한 주행을 마치고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가장 큰 불만은 시트가 몸을 전혀 잡아주지 못한다는 점, 벨트라인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쪽 측면 시야가 좋지 않다는 점, 센터패시아의 스위치들이 터치 스위치인데, 건조한 손으로 만지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열선시트의 3단과 1단이 열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이었다.
반면 고속으로 달릴 때의 하체소음이나 풍절음의 수준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봐도 되며, 일상적인 주행시 느껴지는 넉넉한 파워와 여유 있는 달리기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승차감 등 제법 경쟁력이 있는 구성을 갖췄다.
미국차만을 타온 오너의 이야기로는 차를 출고했을 때 엔진룸에 파이프와 연결부위에 볼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아 본인이 엔진룸의 곳곳을 직접 조였다고 말하고, 터널에 들어갔을 때 오토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아 서비스를 받으러 갔더니 개선품이 없어 교환해도 마찬가지라 그냥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 타다 보면 어딘가 실내의 곳곳이 좀 헐렁하다는 점 등을 불만으로 토로했다.
우리가 언듯 품질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싸구려 재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어필한다. 하지만 fitting이 제대로 되어 있어 계절이 바뀌어도 잡소리를 내지 않는 구조는 단순하고 연결된 부위에 적당한 유격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
작은 부품 여러 개를 아주 타이트하게 조립하는 방식은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가 바뀌면 재질간 열팽창 계수가 달라 어느 특정 온도대에서 잡소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차의 효율적인 조립 방식은 독일차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엉성해 보이고 고급성 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오히려 낮고 잡소리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원래 엄청난 양의 대량생산 체계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미국차들이 흔히 눈속임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만든 듯 평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인 부분에서 고급스럽고 복잡한 구성을 가진 독일차보다 실내 내구 품질이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다.
가장 저렴한 브랜드의 차량에서도 파워트레인에 대한 변별력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과 모든 브랜드가 최소한의 품질은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미지는 앞으로 더 부각될 것이 뻔하다.
좋은 차의 결정 요소가 가격별로 사양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 이외에 깊은 엔지니어링의 차이는 갈수록 작아질 것이다.
포드나 GM이 경쟁력이 없는 차를 만드느라 허비한 시간의 바닥은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현기차 입장에서도 아주 철저한 경쟁차 분석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교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testdrive-

- IMG_0500.jpg (152.6KB)(1)
- IMG_0501.jpg (155.2KB)(0)
- IMG_0502.jpg (148.2KB)(0)
- IMG_0503.jpg (143.9KB)(0)
- IMG_0504.jpg (138.0KB)(0)
- IMG_0505.jpg (127.4KB)(0)
- IMG_0506.jpg (118.7KB)(0)
- IMG_0507.jpg (127.8KB)(0)
- IMG_0508.jpg (135.7KB)(0)
- IMG_0509.jpg (136.3KB)(0)
- IMG_0510.jpg (125.6KB)(0)
- IMG_0511.jpg (87.9KB)(0)
- IMG_0512.jpg (106.8KB)(0)
- IMG_0513.jpg (114.8KB)(0)
- IMG_0514.jpg (89.6KB)(0)
- IMG_0515.jpg (113.8KB)(0)
- IMG_0516.jpg (108.3KB)(0)
- IMG_0517.jpg (150.6KB)(0)
- IMG_0518.jpg (79.8KB)(0)
- IMG_0519.jpg (87.5KB)(0)
- IMG_0520.jpg (97.0KB)(0)
- IMG_0521.jpg (135.6KB)(0)
- IMG_0522.jpg (120.5KB)(0)
- IMG_0523.jpg (135.4KB)(0)
- IMG_0524.jpg (155.7KB)(0)
- IMG_0525.jpg (141.2KB)(0)
- IMG_0526.jpg (116.2KB)(0)
- IMG_0527.jpg (110.3KB)(0)
- IMG_0528.jpg (117.7KB)(0)
- IMG_0529.jpg (117.2KB)(0)
- IMG_0530.jpg (124.8KB)(0)
- IMG_0531.jpg (101.1KB)(0)

변속기 반응속도 는 어떤가요? 제가 물어본 머스탱 컨버터블의 자동 변속기 반응에는 참 실망했거든요. 수동 모드 시 변속이 너무 느리수 울컥되었어오. 2014년 모델임에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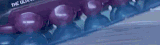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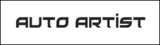

룸미러에 이차가 보이면 제차 속도계를 확인하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