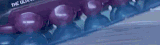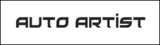Road Impression
글 수 330



안녕하세요 권 영주입니다.
미드 엔진의 복스터 2.7을 소개합니다.
96년 파리 오토살롱에서 처음 본 복스터의 디자인은 550 스파이더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후차축 앞에 마운트 된 미드엔진은 수냉식이며, 초기엔 2.5리터 204마력 사양으로 데뷔했다.
2.5리터 엔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생겨서라기 보단 경쟁차들의 파워가 강해져 할 수 없이 2.5는 2.7로 대체되었고 복스터S가 추가 되었다.
250마력을 발휘하는 복스터S는 배기량을 3.2리터로 늘렸다. 가격도 상당히 많이 뛰었고, 북미의 저널리스트들에겐 증가된 파워와 성능과 비교해 너무 높은 가격상승이었다고 한소리 들었지만 성능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이번에 한국에서 시승할 수 있었던 2.7리터 사양은 220마력으로 팁트로닉 자동변속기에 스티어링휠에 변속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33년간의 공냉식엔진을 종식시킨 복스터의 수냉식엔진은 엔진음이 너무 정제되지 않았나 걱정될 정도로 공냉식 엔진을 가진 선대에 비해 부드럽다.
헤드램프를 비롯한 상당수의 부속을 신형 911인 996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매니어들에게 호되게 욕을 먹었던 포르쉐는 원가절감이나 개발비등의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운전석에 올라 맘을 가다듬고, 충분한 시승시간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 잠깐 고민하게 된다.
그간 911과 968등 여러번의 포르쉐 시승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솟구쳐 오르는 욕망과 흥분이 어느정도 컨트롤된다는 것을 느끼며 왼손을 사용해 이그니션 키를 돌린다.
탁하고 뻑뻑했던 공냉식 엔진음과 비교하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금속성향의 음색이 등 뒤 낮은 곳에서 전해온다.
포르쉐를 사랑하는 매니어들은 차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항상 무언가 신형으로 바뀌면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반발이 거세다. 필자도 거리를 다닐 때 듣게 되는 너무 조용하고 부드러워진 복스터의 엔진음에 실망을 했지만 콕핏에 앉아서 듣는 훌륭하게 다듬어진 엔진에 나도 모르게 쇠뇌 당하고 만다.
스티어링 휠을 정자세로 잡으면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스티어링 휠을 감아쥐게 하는데 검지와 장지가 닿는 부분이 옴폭하기 때문에 스티어링휠에 손에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다.
자동변속 모드로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시 가장 처음 느끼는 기분은 무게감이다.
가속패달이 탄력이 강한 것도 이러한 느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일단 여느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저속에서 강한 레스폰스를 느끼진 못한다.
연속으로 다가오는 타이트한 코너와 도로의 기복에서 수동으로 전환해 변속을 지휘하며, 가속패달의 가감에 따른 엔진음색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9900만원이라는 이차의 가격은 이차가 가진 운전의 희열과 가치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3500rpm부근에서 다시한번 재가속을 보이며, rpm리미트가 작동하는 7000rpm까지 깨끗하게 상승하고 시프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 영역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시프트 업을 진행시킨다.
이차가 진정 빠르다고 느끼는 영역은 160km/h를 넘어서부터이다.
철저하게 고속주행을 위해 길들여진 복스터는 일상적인 급가속 주행으로는 이차의 극히 작은 일부분도 느끼기 힘들다.
미드 엔진은 무게중심이 차의 중심부분에 최대한 응집되어 있다. 911의 핸디캡인 전륜의 하중이 적다는 점, 그로인한 직진안정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복스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포르쉐의 오버스티어는 운전자를 오히려 길들이는 야생마의 기질이었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그 어떤 후륜구동차보다 다루기가 쉽고 예측가능한차가 복스터였다.
3시간 가까이 차를 시승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시도했다.
복스터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코너를 도는 중간에 맨홀등이 지반 일부가 불규칙하게 솟아 올라 코너에서 차가 점프를 할 때이다.
복스터만 가지고 이런 열악한 도로에서 코너링을 시도해 봤자 이차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깨닫기 힘들다.
이날 동참한 BMW 325컨버터블, 사브 9-3 컨버터블, 메르세데스 SLK 230K등을 차례로 동일한 조건에서 시도해보았다.
슬립앵글이 크고 언더스티어 성향이 강한 사브는 같은 속도에서 점프한 후 차선의 절반을 이동한 결과와 비교하면 복스터는 믿어지기 힘들 정도로 마치 땅과 차에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어 어느 이상으로 차가 떠오르는 것을 막는 것처럼 괘도변화가 없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승차감이다. 돌덩이 같은 차체강성은 비틀림이나 차체가 휘는(bending&twist)느낌이 전혀 없고, 쿵쿵거림이 없어 도로의 큰 충격을 지나갈 때 그냥 태연하다.
일반차량의 하부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인 60km/h정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마치 엄청나게 커다란 바퀴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 정도로 짧은 스트로크를 가진 서스펜션에서 이정도의 부드러운 느낌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산하나를 다 넘었다 넘어오는 25분간의 초전력 와인딩로드에서 복스터와 호흡을 맞출 기회가 있었다.
일단 코너를 탈출하면서 가속패달을 힘차게 밟으면 복스터는 언더스티어를 보인다.
각도에 따라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스티어링을 풀면서 느끼는 언더스티어는 가속패달에 준 힘을 늦춰야할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것은 이때 스티어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무게감이다. 여성운전자들이 스티어링 휠이 무겁다는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스포츠성, 운전의 재미, 그렇게 막연한 단어들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단어들일 것이다.
수동변속기를 갈구하며, 팁트로닉으로 변속을 진두 지휘하면서 포르쉐엔 좀 더 진보된 자동변속기가 절실하다.
일단 자동으로 제어되는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담할 공간이 적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엔진 피해를 줄인다는 그럴 듯한 핑계가 항상 함께 하지만 시프트 업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성능좋은 rpm리미터만 갖추고 있다면 구지 추가하지 않아도 되었을 기능이다.
다운시프트 역시 다운 시프트 후 rpm이 6000rpm을 넘는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버튼의 -스위치를 눌러도 시프트 다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필자가 원하는 다운시프트 포인트보다 실제로 한박자 늦은 포인트에서 변속이 되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던지 아니면 코너에서 쉬프트 다운을 경험해야하는데 코너를 한참 돌고 있는 한계상황에서 뒤늦게 시프트 다운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럽다.
페라리 F355나 F360 F1에 있는 다운시프트 시 자동 rpm상승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프트 다운시 생기는 꿀럭임이 그대로 차체에 전해지기 때문에 후륜이 갑자기 밸런스를 잃는다.
속도가 한계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전혀 안되지만 한계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수동변속기 운전자들은 힐&토우를 죽어라고 연습하는 것이다.
후륜이 절대 촐싹대지 않고 항상 듬직하고 코너에서 액셀링에 의해 궁둥이가 점진적으로 약간씩 밖으로 흐르는 것을 느끼며 노련한 운전자라면 차가 전달하는 그립을 잃기 바로 직전을 느낄 수 있다.
스티어링휠을 꺽는 각도와 속도가 어느 특정 영역을 기준으로 뒤가 밖으로 움직이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
타이트한 코너에서 이 현상을 경험하려면 상당히 빠른 코너에서 스티어링 휠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어야하며, 어느 각도이상의 조작에서 후륜이 슬라이딩을 시작한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핸들링은 어설픈 브레이크와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과감한 액셀링은 세계최고의 브레이크가 4륜을 잡아줄 때 더욱 안정되고 과감할 수 있다.
여기에 다운시프트가 절묘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좀 전에 언급했듯자동변속기에서 삑사리가 나는 것이 아쉽다.
포르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차종의 경험이 필요하다.
첨부터 포르쉐에만 익숙해지면 그 참맛을 깨닫기 힘들기 때문이다.
포르쉐는 그 이름만으로도 타 스포츠카를 제압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다.
훌륭한 차를 논할 때 가장 삼가야할 것이 차의 데이터이다. 최고속도, 가속성능을 비교하며 이차가 저차보다 좋네 나쁘네하는 것처럼 만든이를 슬프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포르쉐는 분명 빠른 차이다. 하지만 그 빠르다는 것을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다.
스피드는 포르쉐에서 소중한 부분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