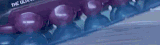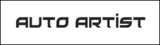Road Impression
글 수 330



미국에서 조립된 Z3의 등장으로 고급 경량 로드스터의 경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포르쉐에선 미드엔진의 복스터를, 메르세데스에서도 4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SLK를, 그리고 약간 늦은 시점에 아우디도 TT를 투입시키게 된다.
96년 데뷔한 Z3의 초대 엔진은 318i에서 가져온 4기통 1.9리터 엔진이었다.
초창기 4기통 2.0과 2.3리터 엔진을 얹은 SLK는 BMW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퍼차져를 장비하고 데뷔했다.
4기통 NA 1.9리터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BMW는 활용가능한 엔진을 대거 동원해 6기통 2.0, 2.5, 2.8리터, 그리고 내친김에 250마력의 포르쉐 복스터S를 데뷔하게 만든 M3 3.2리터 엔진의 M로드스터까지 줄지어 등장하게 된다.
Z3는 미국현지에서 조립된 최초의 BMW로서 주 타켓지역인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차종이다.
Z3 초창기 모델인 4기통 1.9리터를 비롯하여 현재는 3.0으로 대체된 6기통 2.8모델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다뤄볼 기회가 있었던 차종이다.
1999년 겨울의 문턱에서 창원 F-3가 끝나고 머신의 배기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필자와 F-3진행차량이었던 Z3 2.8은 F3머신의 발자취를 추종하며, 총 20랩을 함께 했었다.
Z3는 로드스터로서 보기 드물게 차체강성이 강하고, 2.8의 경우 트랙션 컨트롤의 작동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서포트가 확실했었다.
Z3는 필자를 즐겁게 했던 기억을 많이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차종중 하나였다.
이에 비해 M로드스터는 Z3에 뿌리를 두긴 하지만 Z3를 그저그런 평범한 로드스터로 보이게 할 정도로 요지적소에 포인트를 주어 스포츠성을 강조한다.
일단 두툼하게 부풀려 놓은 뒤 오버휀더안에 위치한 245/40.17ZR, 전륜은 225/45.17ZR을 사용하며, E36 M3와 같은 타이어 사이즈이기도 하다. 짧은 전장과 딥 디쉬 타입의 휠은 주행성능을 예고라도 하듯 당당하다.
실내에 들어가면 일단 스포츠 버킷 시트가 차의 캐릭터를 확실히 대변하며, 초기에 수동으로 열고 닫던 소프트 탑은 경쟁차종의 압박으로 인해 전동으로 이미 바뀐 상태였다.
M로드스터에 탑재된 엔진은 BMW의 모터스포츠를 관장하는 M GmbH에 의해 정성껏 만들어진 엔진으로서 240마력을 6000rpm에서 발휘하며, M쿠페와, E36 M3의 그것과 같은 엔진이다.
탑을 오픈한 체 시동을 걸었다.
전장이 짧고, 머플러와 운전자가 가깝게 위치해서인지 M3보다 오히려 생생한 배기음이 뒤에서 다가온다.
깊이가 깊은 클러치 패달을 밟고 전진기어를 위치시키며, 명품엔진에서 토해지는 힘을 도로에 전달하는 작업은 도로와 머신의 교감을 연출하게 하는 운전자의 몫이다.
언제 들어도 반가운 M사운드는 일상에 지친 운전자에게 활력을 줄 만큼 소중한 것이다.
파워트레인쪽을 평가하자면 힘의 크기야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독일형 M3의 독립쓰로틀 320마력 사양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완성도쪽을 평가한다면 단점을 찾을 수가 없다.
변속기는 1단 기어 좌측에 위치한 후진기어로 변속을 위해 몸쪽으로 쉬프트 노브를 당기는 일이 여성운전자에게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주행중 변속이 정교하고, 실수의 확률이 적다.
328i의 6기통엔진을 걔량해 만든 북미사양 M 3.2엔진의 특징은 1000rpm에서부터 레드존이 시작되는 6500rpm까지 음색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회전이 날카로우며, 토크가 플랫하다.
직립적인 엔진의 반응과 약간은 포장된 듯 날카롭게 들려오는 엔진의 회전 상승음은 BMW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는 BMW의 몸부림으로 대변될 만큼 그 느낌을 간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E36 M3와 비교해 5단의 기어비가 약간 낮아져 5단 100km/h가 2700rpm을 그리는 M3에 비해 2500rpm을 보인다.
반응이 좋은 엔진과 대체적으로 저단에서 약간 높은 기어비를 선택하고 있는 컨셉으로 인해 차의 움직임은 수치적인 느낌보다 두배는 경쾌하다.
차량중량과 비교해 엔진의 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운전석이 전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쪽으로 쏠려있는 구조는 전후 무게배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핸들링은 포르쉐 복스터를 상당히 의식하고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너에서 복스터만큼의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날쌘 다람쥐처럼 요리조리 차선을 낚아채도 동승자가 요동치지 않는다.
트랙션 컨트롤의 일종인 ASC는 코너에서 파워를 강하게 줄 경우 들린쪽 바퀴의 공전을 원천봉쇄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운전자가 가급적이면 눈치채지 못하게 부드럽게 작동하게 만들려고 꽤나 신경을 쓴 모양이다.
거만한 운전자가 코너탈출시 의도적으로 강타한 가속패달에 트랙션 컨트롤이 너무 요란하게 작동할 경우 '어쭈 이거봐라. 지가 감히?' 하며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이런 경우 운전자는 신경질적으로 트랙션 컨트롤의 스위치를 꺼버릴 것이다.
M로드스터의 트랙션 컨트롤은 Z3 2.8로 서킷에서 이미 테스트해본 장비이지만 은근히 작동되는 것이 매력이며, 작동 상태는 계기판에 노란 경고등이 점등되는 것으로 트랙션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스위치로 끌 수 있는 장비이다.
후륜구동은 확실히 전륜구동을 다루던 솜씨와 이론으로 접근하기엔 차의 모션을 결정하는 변수가 많은 편이다.
후륜구동 차량은 무조건 오버스티어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정설이 아니다.
전륜구동 심지어 풀타임 4륜으로도 얼마든지 드리프트를 즐길 수 있고, 원하는 동작은 뭐든 만들 수 있다. 언제나 뉴트럴 스티어를 보이는 차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언더나 오버만의 특성을 가지는 차도 없다.
즉 언더스티어는 어느차종이든 연출할 수 있고, 오버스티어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로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운전자는 차의 기본주행원리를 이해하면 손쉽게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를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쉽게 차의 모션을 바꿀 수 있느냐는 요즘의 차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뒤가 밖으로 흐르게 하는 원리는 구동륜이 앞쪽이냐 뒤쪽이냐가 아닌 주행중 무게중심 이동에 의해 노면에 실린 후륜의 하중이 줄어들면서 만들어진다.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무거운 구조를 가진 포르쉐 911조차도 와인딩로드에서 얼마든지 가속패달 밟는 조작만으로 전륜구동 차량에서 흔히 경험하는 throttle on 언더스티어를 만들 수 있다.
M로드스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단 언더스티어를 맘대로 만들 수 있고, 가속패달을 놓으면서 뒤가 밖으로 흐르는 정도는 차량의 속도와 코너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왠만큼 빨리 달리지 않으면 후륜이 그리 쉽게 흐르지 않는다.
후륜의 슬립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직각으로 꺽어진 차선 2개정도 넓이를 가진 코너를 60km/h 정도로 진입해서 코너 정점을 지남과 동시에 스티어링을 풀면서 가속패달을 강타하는 것이다. 항상 코너 탈출 직전에 약간씩 밖으로 벗어나는 후륜을 느낄 때 다시말해 액셀링에 의한 오버스티어가 바로 진정한 후륜구동의 묘미라 하겠다.
BMW의 전후 50:50무게배분을 논하기 이전에 BMW의 강점이라면 쓰로틀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의 무게중심의 전후 이동이 적다는 점 그리고 각이 작은 코너에서도 맘놓고 쓰로틀을 열어도 차량 후미의 컨트롤이 쉽다는 점이다.
과격하고 예측불허의 특성을 가진 차량들이 순수 스포츠성이라는 나름의 변명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참 많다.
진정한 기술은 누구나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가 차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컨트롤하는 운전자를 얼마나 지지해 줄 수 있느냐가 진정 훌륭한차를 평가하는 잣대일 것이다.
M로드스터는 차량의 기능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운전성만 고려한다면 M3보다 운전이 훨씬 재미있고 오픈형이라 쾌적하다.
신형 E46 M3의 심장이 333마력으로 강해진 이상 M로드스터 역시 새 심장을 나누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포르쉐 복스터의 행보가 과히 궁금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호기심일 것이다.
-test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