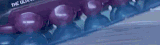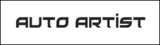Road Impression
글 수 330





로터스는 6.70년대 모터스포츠계의 큰 획을 남긴 메이커로 현재는 영국을 대표하는 Pure sports car를 만드는 메이커로 매니어들의 인지도가 높다.
콜린 채프만의 열정을 담아 만든 로터스 에스프리는 76년 데뷔했고, V8 3.5리터 트윈터보로 대폭적인 파워트레인 변경 이전에는 4기통 엔진들을 사용했었다.
터보차져가 장착된 이후의 후기형 4기통 엔진들은 리터당 100마력을 훌쩍 넘는 것으로 유명했고, 디자인이 바뀌지 않고 27년을 버틸 정도로 데뷔당시 디자인은 혁신 그 이상이었다.
76년 데뷔 때 에스프리는 트윈 카브레타가 장착된 2리터 160마력에 최고속도 200km/h, 0->100km/h가속시간 8.6초를 자랑했었고, 80년에 들어서면서 2.2리터로 배기량이 커진다.
2.2리터로 배기량이 커진 후 얼마 안돼 같은 해 Lotus Essex Turbo Esprit이라는 이름으로 터보차져를 장착해 210마력으로 출력을 높인 고성능 버전이 등장한다.
최고속도 240km/h, 0->100km/h 5.6초의 주행성능은 1148kg이라는 가벼운 몸무게에 미드십 레이아웃과 함께 정통 스포츠카가 갖춰야할 모든 것을 갖추고 숙성에 들어간다.
96년 V8로 파워트레인이 바뀌기전까지 2.2리터 엔진은 264마력까지 발전했고, 4기통 고부스트 엔진의 매력을 십분 발휘했다.
이번에 시승한 Esprit는 V8 GT라는 모델로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된 차종이다.
V8 트윈터보 엔진이 뿜어내는 355마력의 최고출력에 최고속도 274km/h, 0->100km/h 4.8초를 자랑한다.
나의 에스프리에 대한 기억은 어릴 적 한참 심취해있던 컴퓨터 자동차 오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8년 전에 즐기던 Testdrive라는 오락에 등장했던 차종은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페라리 테스트로사, 포르쉐 911, 시보레 콜벳, 그리고 로터스 에스프리였다.
경찰을 피해 편도 1차선 국도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보면 정면추돌의 위험도 있고, 차종마다 정해진 레드존 이상의 회전수를 넘으면 엔진이 깨지는 설정이 재미있었다.
로터스는 오락에서도 카운타크나 테스트로사보단 속도는 느리지만 엔진 회전상승이 경쾌하고 핸들링이 민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오락이기 때문에 실제 주행과는 차이가 있지만 내 기억속에 에스프리는 그렇게 자리잡았었다.
약 20년이 지나서야 실제로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오락이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라 감회가 새로웠다.
로터스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에스프리의 대외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한 시승보단 머리를 백지상태로 비우고 그냥 에스프리 자체를 느껴보기로 다짐했다.
시승을 위해 콕핏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스포츠카로서 감수해야할 불편함의 시작이다.
V8 트윈터보 엔진음이 빨리 듣고 싶어 타자마다 시트 포지션도 잡기 전에 시동부터 걸었다.
등뒤에서 전해오는 압력과 진동이 웅장했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V8과는 애초에 그 느낌과 회전질감에서 큰 차이를 준다.
V8이 주로 낮은 저음을 강조하고 묵직한 특성이라면 에스프리의 V8은 엔진이 조금 거칠고 뻑뻑하다.
스포티하고 남성적인 사운드를 풍긴다는 감성적인 측면 뒤의 현실은 거창하고 요란한 어찌보면 밸런스보단 파워를 고려한 세팅으로 보인다.
운전자세를 잡는데 일반 차량보다 두배는 족히 될 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다.
시트포지션이 아주 낮고, 패달이 저 멀리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발을 완전히 쭉 편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다.
체인지레버를 1단에 넣고, 클러치 패달을 떼보면 무거운 클러치는 밟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야수와도 같은 엔진의 회전을 땅바닥에 전달하는 과정이 조심스럽고, 수공차를 운전하는 오너 입자에선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즉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손으로 마술과도 같이 엔진을 만들고 그 힘을 길이 4m남짓 되는 공간에 가두어 필요할 때 발가락 조작으로 꺼내쓴다는 개념이 너무도 재미있다.
클러치 미트는 무거운 클러치에만 적응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변속기는 짧은 왕복 스트로크보다 두배는 짧은 좌우 스토로크 때문에 1단에 넣을 땐 몸쪽으로 힘주어 당겨야 3단으로 출발을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일반 승용차와 완전히 다른 운전 감각으로 인해 운전의 집중력을 초기에 많이 빼앗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차에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풀가속을 시도해 가속 후 속도를 줄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굳었던 근육이 풀리는 상태를 끌어내는 것이 좋다.
1단 4000rpm에서 클러치를 미트시키니 후륜이 통통튀면서 헛바퀴가 돌기 시작하고, 1단 7000rpm에서 2단으로 변속, 7200rpm에서 100km/h를 가르킨다.
3단 7000rpm에서 150km/h를 약간 못미치고, 4단으로 200km/h, 5단 5500rpm에서 220km/h를 마크한다.
3500rpm에서부터 부스트가 살아나고 4000-5500rpm까지가 가장 큰 펀치가 실리는 영역이다.
회전한계는 7400rpm이며, 레드존이 없기 때문에 감각으로 최적의 변속시점을 찾아야 한다.
6500rpm이후부턴 부스트가 떨어지면서 펀치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회전상승이 큰 1단과 2단을 지난 3단 이후부턴 회전수에 욕심을 내기 보단 6500rpm정도에서 변속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대배기량 터보엔진이기 때문에 1단과 2단의 가속보단 4단과 5단의 가속이 훨씬 인상적이다. 맹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강력한 배기음과 함께 느껴지는 고속펀치는 차를 다루는 재미를 배로 증폭시킨다.
밋밋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차의 동작 하나하나가 거창하고 요란하다.
스포츠카다운 모습이 다분하다 못해 넘쳐 흐른다.
한번 고속으로 내달리고 나니 낮은 속도에서 차를 다루는 손과 발이 익숙하고, 이 맹수와도 같은 차와 조금 친해진 기분이 든다.
차의 전반적인 감각이 충분히 튼튼한 차체와 4피스톤 브렘보 전륜 브레이크는 급제동시 뒤가 전혀 뜨지 않고, 궁둥이가 밑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처럼 제동밸런스가 좋게 느껴진다.
코너를 돌면서 급출발할 때는 안쪽 바퀴가 쉽게 공전하기 때문에 금세 레드존을 쳐버리지만 양바퀴가 그립을 한 상태에선 후륜이 그리 쉽게 공전하지 않는다.
스트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강인한 하체는 뼈대의 강인함이 느껴지지만 스티어링과 엉덩이로 느껴지는 강성과 전반적으로 부품들이 조여진 정도를 언급한다면 약간 헐겁다.
노면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은 좋지만 코너에서 느껴지는 스티어링의 정교함이 약간 아쉽다.
로터스는 같은 모델을 30년 가까이 만들면서 세세한 변경이외에 단 몇 차례의 파워트레인 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로터스는 하드웨어를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단 숙성으로 얻을 수 있는 완성도에 더 비중을 둔 차만들기를 하는 모델이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해 야기되는 품질의 한계를 로터스 역시 완벽하게 극복하진 못한 것 같다.
이차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립된 수공차가 전해줄 수 있는 감성과 설계한 사람과 만든 이의 마인드가 일치했을 것 같은 확신과 가치를 생각했을 때 정성껏 조립된 로터스는 그 소유가치를 일반 양산 스포츠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안될 것 같다.
에스프리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선대 모델을 좀 더 타보아야겠다는 여운을 남기는 시승이었다.
-testkwon-